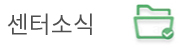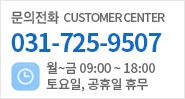지하철에서 옆자리 승객을 추행했다고 의심받은 중증 발달장애인이 검찰 수사로 누명을 벗었다. 철도 경찰은 그에게 자필 각서를 작성하게 했으나 검찰은 이를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.
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(부장검사 장혜영)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·반포,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이모 씨(20)를 지난달 20일 무혐의 처분했다.
이 씨는 지난해 6월 7일 지하철 1호선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과 팔꿈치 등이 닿아 추행 의심을 받았다. 잠에서 깬 여성은 이 씨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신체 부위도 촬영한 것으로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.
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같은 달 17일 지하철에서 이 씨를 붙잡아 ‘옆 사람의 팔과 손을 만지고 사진을 찍으려 했다’ ‘추후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겠다’ 등의 내용이 담긴 자필 출석각서를 받은 뒤 사건을 동부지검에 송치했다.
검찰은 재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했다. 이 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했으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 발견되지 않았다. 검찰은 여성의 진술만으로는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고, 이 씨의 각서도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.
이 씨 변호를 맡은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“이 씨는 (각서의) 문장을 스스로 쓸 능력이 없는 중증 발달장애인”이라며 “(특별사법경찰이) 불러주거나 미리 써놓은 글을 베낀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”고 주장했다.
(후략)